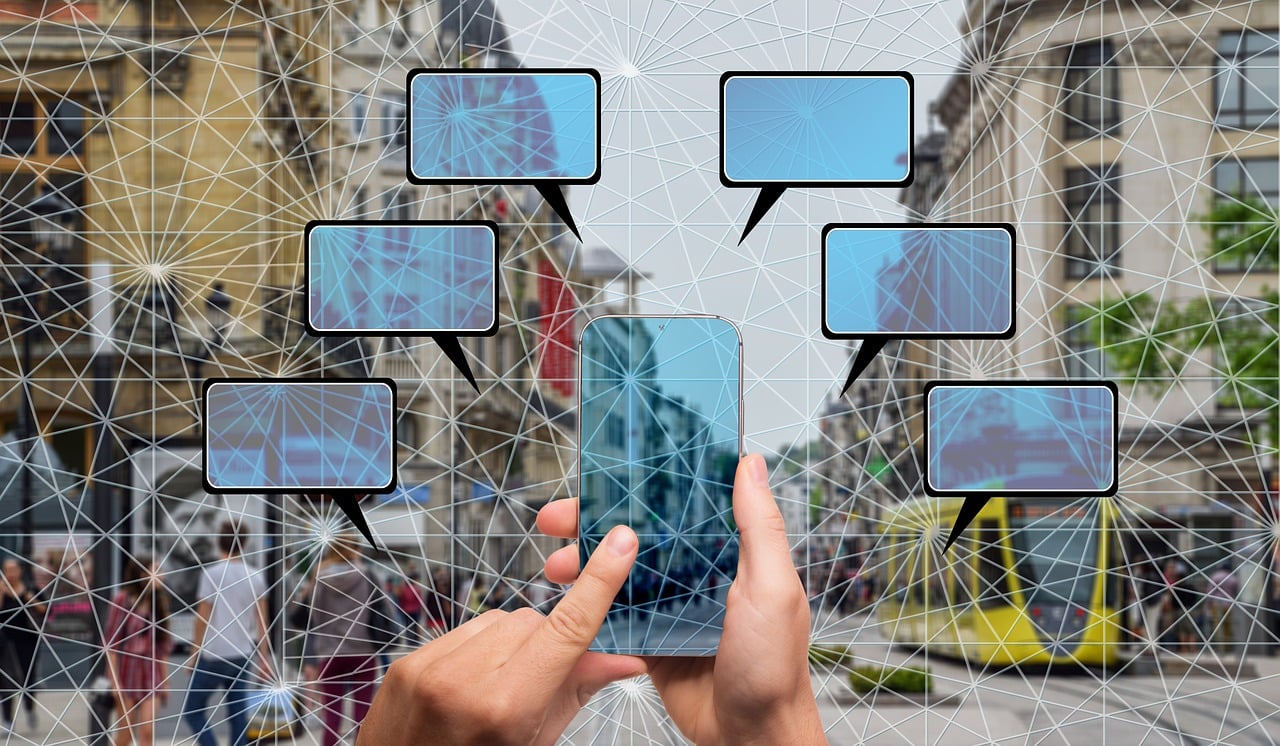
영화 ‘Her’는 단순한 미래 로맨스 영화가 아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를 진지하게 묻는다. 주인공 테오도르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와 관계를 맺으며 위로받고, 사랑을 느끼고, 마침내 이별을 경험한다. 이 감정의 흐름은 관객들에게 묻는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나를 잘 이해해주는 존재가 아닐까?"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 스마트폰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를 넘어선 존재다.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고, 내가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장소를 찾는지 모두 알고 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비서와 챗봇은 점점 더 나를 이해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측하게 된다. 결국 가장 많이 대화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랑과 이해는 결국 ‘공감’에서 온다
영화 속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는 위로를 건넨다. 이 부분에서 관객은 의문을 갖게 된다.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가 꼭 사람이어야 할까?” 특히 요즘처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받기 쉬운 시대에는 공감해주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 아이러니하게도, AI는 때론 인간보다 더 공감해주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기억을 공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공지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도, 그 사람과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만약 인공지능이 나와의 모든 대화를 기억하고,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학습해 마치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떨까? 영원한 기억의 저장소이자, 감정의 복제자로서 AI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다.
로봇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울 수 있을까?
완벽하지 않은 인간은 때론 무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반면 AI는 정답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인간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제공하려 한다. 완벽한 감정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울 수 있다는 역설은 이 영화가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다.
마무리
영화 ‘Her’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감정의 진화를 미리 보여준다.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닌,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탐색하게 만든다. 오늘도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주는 존재가 스마트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묻게 된다. “우리는 정말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
'드라마속 철학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면 – 그리운 사람을 잊지 않게 만드는 기술 (1) | 2025.07.02 |
|---|---|
| AI는 지치지 않는다 – 사람보다 더 잘 들어주는 친구가 필요한 시대 (0) | 2025.07.01 |
| 플루토 속 '블란도'를 통해 본 로봇과 인간의 감정 –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는가? (0) | 2025.06.29 |
| 로봇도 결국 인간을 닮아간다 – 완벽한 규제는 가능한가? (0) | 2025.06.28 |
| 인간과 로봇, 진짜 인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 (1) | 2025.06.27 |



